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에 대해 알아보는 그 세 번째 만남! 오늘은 인문학적 시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문키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예술강사, 교육기획자, 기관 ∙ 단체 실무자 등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마 많은 현장 실천가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며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버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문키움’은 인문학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강사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보실 수 있는 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인문학’이란?
인간에 대한 질문
인문학은 인간과 다른 인간, 이를 둘러싼 문화에 대한 탐구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door)
문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에 내느냐에 따라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에게 이러한 ‘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학생
인문학은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이 끝날 때까지 배우는 ‘학생’이 아닐까요?
■ 왜 ‘인문키움’인가?
여러분은 ‘문화예술교육’과 ‘인문학’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개개인이 지닌 ‘자신만의 답’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문화예술교육이 ‘자신만의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te에서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철학, 문학, 미학, 예술비평과 같이 각기 다른 분야로 ‘인문키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문키움, 말,말,말!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탐색 – 철학과 문화예술교육
이지애,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철학 하기(doing philosophy)로서의 철학교육의 특징과 문화예술교육의 접점은 ‘보편성, 치유와 통합, 공동체성’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에 ‘예술하기, 예술함(Doing arts/Arting)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전설 따라 동네 한 바퀴 – 신화와 문화예술교육
정재서,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교수
“상상력은 자유롭지 못하며, 문화적 환경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구문화를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동양신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를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 예술 감상 – 문학과 문화예술교육
김소연 시인, 어린이 도서관 ‘웃는책’ 전 관장
심보선 시인,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이 시간에는 모두 시를 쓰는 사람이 되어 시가 어렵고 낯설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제작, 즐거운 놀이로 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를 쓰는 재료인 단어를 다른 곳에서 빌려 와 새로운 나만의 시를 써봅시다.”
■ 인문키움, 직접 만나보세요!
11월 28일 수요일에는 ‘예술강사다움’의 조건- 정체성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키움을 직접 만나보세요!
글 | AA 리포터 _강우리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모든 이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고민하기!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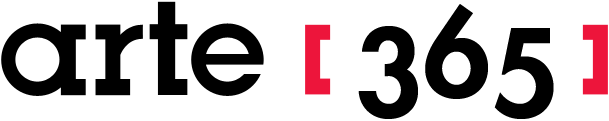























인문키움, ARTE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름들이 참 다 예쁜 것 같아요 🙂
인문학, 처음에 들을 때는 왠지 어렵고 답답한 학문처럼 느껴졌는데
인문학에 대한 삼행시를 보니.. 조금 친숙하고 한 번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
삶이 끝날 때까지 배우는 학생으로 인문키움에 참석해야될 것 같습니다 ㅎㅎ
기사 잘 읽었습니다. 🙂
아르떼에서는 이름 하나 지을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지으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의미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숨어 있는 의미들도 있지요.
인문키움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시지 못하더라도,
오늘 책 한 권 읽으면서 사색하신다면
나만의 인문키움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드네요^^
인문키움. 인문을 키운다는 표현 자체가 와닿네요.
왠지 인문의 씨앗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한다는 느낌이라 그것을 키운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
요 며칠 전, 시를 즐거운 놀이로 접근하는 활동을 나름대로 해보았었는데,, 꽤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사를 통해 전문가님들의 ‘문학과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인문의 씨앗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를 즐거운 놀이로 접근하는 활동!!!
그것이 바로 저희 인문키움 제 3차 프로그램 이었는데요.
다음 기사가 바로 이 프로그램의 스케치랍니다~
신나윤님께서 하셨던 활동도 너무 궁금하네요^^